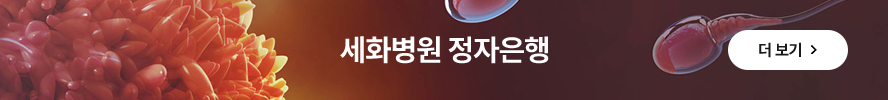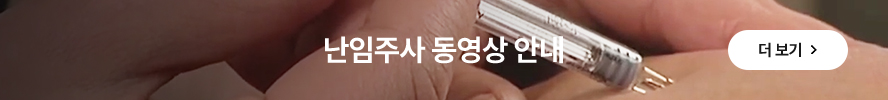Media Report
언론보도
[세화아카데미2025] 건축가 승효상, 아파트 돈 되지만 행복하지 않아 비움과 나눔의 집짓기 하자
페이지 정보
- ‘도시와 건축’ 주제 인문학 특강
“모든 건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나서 없어지기도, 중력에 의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을 통해 얻는 것은, 그 건축에서
살았다는 그런 기억만 진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건축 자체는 하드웨어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게 건축의 본질입니다.”
건축가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메타시티와 빈자의 미학’ 주제의 강의 말미에 강조한 대목이다. 지난 23일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세화병원 주최의 ‘세화아카데미
2025: 과학과 인문학의 소통’ 행사 때의 일이다.
■ “나쁜 건축은 나쁜 사람 만들 뿐”
승 대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무려 5000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이 휩쓸고 간 뒤 건축학자, 도시학자들이 모여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열악한 도시 환경에 있다고 결론 내고 거주 노동 여가 교통 등 기능 중심으로 도시를 바꾸자고 논의한다. 벌집 같은 도시의 주거공간이 아니라 모로코의 페스(Fez)
처럼 ‘공공 영역’이 살아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789년 건설된 페스 곳곳의 공공 영역은 빵집 우물이 있는 공유와 공동체의 공간이다. 이 같은 공동체의
건강함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마을’의 뜻인 동(洞)이다. 우물 개천 등을 끼고 이웃 간 서로 연결됐다.
하지만 이러한 달동네와 같은 동(洞)은 개발업자의 표적이 된다. 서울의 마지막 하늘동네 ‘중계본동 104마을’이 그렇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된 이 마을에 개발의 붉은 깃발이
곳곳에 꽂히자 승 대표를 비롯한 건축가들이 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마을 지키기의 대안으로 ‘주거지 보존구역’ 설정을 제시했다. 지형과 길 터 삶의 방법 등 네
가지 원칙을 지켜내면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다며 행정당국을 설득했다. 그러나 104마을의 철거 작업이 지난 5월 시작됐고, 오는 2029년 무렵 마을이 사라진 자리에 3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승 대표는 “아파트를 짓다 보면 돈은 잘 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 서울은 경제력이 세계 6위 도시인데, 삶의 질 순위는 80위다. 지난해
하루 40명이, 36분당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라가 한국이다. 나쁜 건축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빈자의 미학’은 ‘비움·나눔·절제’
승 대표는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빈자의 미학’을 건축의 중심에 둔다. ‘빈자의 미학’은 ‘가난한 사람의 미학’이 아니라,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의 미학이며, 자본과 경제
논리가 아닌, 비움과 나눔, 절제 겸손을 통해 인간적인 삶의 본질과 생명력을 찾는 철학이다. 그래서 승 대표는 ‘건축(建築)’이란 일본식 용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짓기’가 마음에 들어했다. 집 짓기, 옷 짓기, 밥 짓기 등의 ‘짓기’다. 이는 사회적 창조의 과정을 담고 있어 고대 그리스어 ‘테크톤(tekton)’과 맞닿아 있다.
‘tekton’은 ‘장인’ ‘기술자’ ‘건축업자’를 뜻했다. 이 단어는 영어 ‘architecture’의 어원이 되는 ‘archi-tecture’에서 ‘tecture’에 해당한다.
승 대표가 ‘빈자의 미학’을 투영한 사례 중 하나는 제주의 마을스테이 ‘애월한거(涯月閑居)’이다. 해송 45그루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21채의 건물이 여기저기 서 있다. 승 대표는
“땅의 주인이 소나무였다. 처음 만난 날 소나무가 내게 이야기하는 듯했다. 나는 이렇게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전했다. 그래서 소나무마다 영역을 표시하고 담장과 집을
불규칙하게 둘러 세웠다. 집도 소나무를 위주로 지었으니, 소나무가 두 그루 있는 곳은 ‘이송재(二松齋)’, 소나무가 없으면 ‘무송재(無松齋)’, 소나무가 가운데 있으면 ‘송중한
(松中閑)’ 등으로 집마다 이름을 붙였다. 창문을 열면 온통 나무(閑)인 곳에서 사는(居) 셈이다.
1952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승 대표는 서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비엔나공과대학, 베이징중앙미술학원 강단에 섰다. 지금은 동아대 석좌교수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내기도 했다. 15년간 김수근의 문하에 있다가 1989년 이로재를 설립했다.
ⓒ오광수 선임기자
관련링크
- 다음글[세화아카데미2025] 방사선 치료 전 가임력 보전안…인문학으로 들여다본 난임의학 25.08.07